적은 누구인가 / 문강형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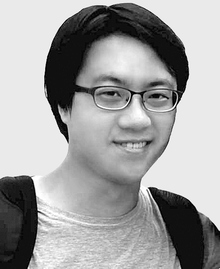
지난 4월16일에 발생하여 3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침몰 사건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재난이다. 지진이나 홍수도, 공격이나 테러도 아닌 재난, 암초나 기상악화 때문도 아닌 상황에서 어이없이 발생한 이 재난은, 옛 서양인들이 ‘디자스터’(disaster)라는 말을 통해 뜻하고자 했던 ‘잘못된 별자리’, 곧 ‘운명의 장난’ 같은 것과는 상관이 없다. 4월16일의 재난은 ‘운명’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현대적인 개념인 ‘합리성’, 곧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적 합리성과 연결되어 있다. 기업비용 절감을 위해 선박 운용 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늦춰주고, 이에 맞춰 건조된 지 18년이 넘은 낡은 배를 싼값에 사서 운행하고, 무리하게 배를 개조해 짐과 승객을 늘리며, 선장 등 직원을 계약직으로 고용해 쉽게 부리고, 선박안전검사를 신속히 통과시키는 모든 행위는 이 도구적 합리성으로 귀결된다.
이 악마 같은 ‘합리성’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 경제적 합리성이다. 모든 것을
경제화하여 계산 가능하고 절감 가능한 것으로 치환시켜 사고하는 이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이 사실은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을 세월호 침몰 사건은 보여준다. 죽은 알바생 직원에게는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 계약된 업체만을 고집하며
구조에 차질을 빚는 해경의 모습은 삶을 지배하는 신자유주의가 죽음마저도 지배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삼풍과 성수대교에서 세월호로 이어지는 거대한 재난은 비정규직 대우와 손쉬운 해고에 분노하다 자살하는 노동자들, 합리성과 효율성에
최적화된 인간을 생산하기 위한 살인적 교육 속에서 괴물이 되어가는 청소년들, 만성적인 스트레스, 우울증과 폭력에 시달리는 한국인
전체가 겪고 있는 일상적 재난의 확장판이다. 어쩌면 신자유주의는 삶 자체를 재난화하는 체제이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묘사하듯
재난 속에서 살아남는 능력을 미덕으로 만들어내는 변태적인 체제다.
이 변태적인 체제를 합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는 이 재난을 일으킨 또 하나의 원인이다. 분노한 국민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과
관료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이유는 이들이 ‘미개’해서가 아니라, 이 일상화된 재난의 배후가 국가라는 점을 이들이 직관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슬픔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여기에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거리로 쏟아지는 분노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캐묻는 행동이다. 실로 재난이
만들어낸 이 역동적 국면이야말로 진정 ‘정치적’인 것이다. 칼 슈미트의 말처럼 정치의 본질은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분노는 ‘적’이 누군지를 묻는 절박한 물음이다. 정치는 처단할 적을 명명하는 주권자의 행위이며, 세월호와
일상의 억울한 죽음들은 바로 그 적의 정체를 가리키는 지표다.
적은 누구인가? 인간을 일회용으로 여기는 자본과 그 자본의 마름인 국가다. 적을 향한 절박한 분노는 화석화된 정치를 부활시킬
기회가 된다. 이 분노는 자본과 국가의 질서를 거부하는 다양한 개인적 경로를 만들어내는 행동, 궁극적으로는 자본과 국가의 운영
자체를 뒤바꾸는 집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때 의미를 갖는다. 다시는 일상화된 재난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이야말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실행하는 일 말이다. 이 일을 가리키는 이름이 ‘민주주의’다. 4월16일의 재난은 비통한 상처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울 가능성을 품은 정치적 사건이다. 이 가능성을 외면할 때, 상처는 봉합되기 전에 다시 도질
수밖에 없다.
문강형준 문화평론가
출처: 한겨레신문 논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