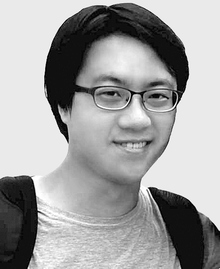 |
문강형준 문화평론가 |
문강형준 문화평론가
출처: 한겨레신문 논단
박근혜의 눈물 / 문강형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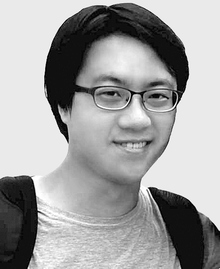 |
문강형준 문화평론가 |
문강형준 문화평론가
출처: 한겨레신문 논단
 핵발전소를 수출하면서 북한 핵을 벌벌 떠는 나라
핵발전소를 수출하면서 북한 핵을 벌벌 떠는 나라
 [단독]해경, 침몰 직후부터 "구조 종료…진입말라" 당일 오전 속속 도착했지만…119잠...
[단독]해경, 침몰 직후부터 "구조 종료…진입말라" 당일 오전 속속 도착했지만…119잠...
 박근혜의 '신뢰' 기준이 무엇인지 봅시다. 5개월 동안 하루에 1,000만원 번 안대희 국...
박근혜의 '신뢰' 기준이 무엇인지 봅시다. 5개월 동안 하루에 1,000만원 번 안대희 국...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 있네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 있네
 무한경쟁은 미친짓이다.
무한경쟁은 미친짓이다.
 ?3
?3
 역시 신이 되고픈 사람은 돈도 좋아했지만 여자를 더 좋아했다-고영민님 참조2
역시 신이 되고픈 사람은 돈도 좋아했지만 여자를 더 좋아했다-고영민님 참조2
 여자 복 터져서 친구 손에 죽은 반신반인1
여자 복 터져서 친구 손에 죽은 반신반인1
 세상이 종교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 !!
세상이 종교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 !!
 [한겨레그림판] 눈물1
[한겨레그림판] 눈물1
 그래 노무현 때문이라니까 왜들 그러셔?9
그래 노무현 때문이라니까 왜들 그러셔?9
 박근혜 눈물의 구성요소: 그의 눈물 앞에서 감동 대신 끔찍함을 느끼는 이유6
박근혜 눈물의 구성요소: 그의 눈물 앞에서 감동 대신 끔찍함을 느끼는 이유6
 조광작 목사, '세월호' 망언 사과·한기총 부회장 사퇴..오정현 목사도 '구설'1
조광작 목사, '세월호' 망언 사과·한기총 부회장 사퇴..오정현 목사도 '구설'1
 세 번째는 마지막이다
세 번째는 마지막이다
 훌륭한 지도자들의 9가지 특징
훌륭한 지도자들의 9가지 특징
 오정현도 한마디 얹는구나..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정몽준 아들 미개 발언 틀린 말...1
오정현도 한마디 얹는구나..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정몽준 아들 미개 발언 틀린 말...1
 대통령 눈물 흘릴때 함께 눈물흘리지 않는 사람은 백정,용공분자....한기총3
대통령 눈물 흘릴때 함께 눈물흘리지 않는 사람은 백정,용공분자....한기총3
 정치 떠난 유시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조선> ... [분석] '유시민'으로 지방선거...
정치 떠난 유시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조선> ... [분석] '유시민'으로 지방선거...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을 두고 '검은 원숭이'라고 비하했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을 두고 '검은 원숭이'라고 비하했다
 세월호 유족 대국민 호소문
세월호 유족 대국민 호소문
 보아야 이해되는 3행 그림4
보아야 이해되는 3행 그림4
 조갑제 :선동에 굴복한 海警해체-광우병 亂動때의 李明博보다 더 심각한 朴대통령의 리...1
조갑제 :선동에 굴복한 海警해체-광우병 亂動때의 李明博보다 더 심각한 朴대통령의 리...1
 사람들아 부릅뜨라1
사람들아 부릅뜨라1
 시원하게 감상해보세요
시원하게 감상해보세요